[詩 에세이] 함께 읽는 명시 _ 시(詩)
 목록으로
목록으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지혜의숲
- 작성일
- 22-09-30 18:45
본문
지혜의숲과 함께 읽는 명시 '시(詩)'입니다.
시(詩)_파블로 네루다
그러니까 그 나이였다……. 시가 나를 찾아온 게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겨울에서 왔는지 강에서 왔는지 언제 어떻게 왔는지 모른다 그것들은 목소리도 아니었고 언어도 아니었고 침묵도 아니었다 하지만 길거리에서 나를 불렀다 밤의 가지에서 갑자기 다른 것들로부터 맹렬한 불길 속에서 아니면 홀로 돌아오는 길에 얼굴도 없는 나를 건드렸던가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내 입은
이름을 말할 수 없었고 눈은 멀었는데 무언가가 내 영혼 속에서 꿈틀거렸다 열병인지 망각의 날개인지 그래서 나는 내 방식대로 써 보았다 그 불을 해독하면서 어렴풋이 첫 행을 썼다 어렴풋한, 내용없는, 순수한 넌센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순수한 지혜 그러나 나는 문득 보았다 풀리고 열린 하늘을 유성들을 고동치는 대지를 화살과 불과 꽃으로 벌집처럼 구멍 난 그림자를 굽이치는 밤을, 우주를
그리고 아주 작은 존재인 나는 별빛 가득한 거대한 공간과 신비의 이미지에 취해 나 자신이 그 심연의 일부임을 느끼며 별들과 함께 빙빙 돌았고 내 가슴은 바람결에 풀어졌다
네루다에게 갑자기 시가 찾아왔듯이 20대에 나의 삶을 뒤흔든 방문객이 있었다. 나에겐 그것이 불꽃 같은 시(詩)였다. 혹독한 겨울, 모든 것이 얼어붙은 차디찬 방에서도 뜨거운 숨을 내쉬게 했던 그것. 모든 의미와 가치의 시작이자 종착역이었던 그것. 질풍노도의 젊은 욕정까지도 잠재우고, 모든 세속적인 욕망을 정신병으로 치부하게 했던 그것. 개인적 사랑과 애정마저 사치스럽고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기게 했던 그것. 그러나 나에겐 활활 타오르는 또 다른 열정이 있었다. 이제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라고 부르는 내 영혼의 화살이었다.
시(詩)란 그런 것이 아닐까? 이름을 말할 수 없고 눈은 멀었는데 내 영혼 속에서 꿈틀거리는 그것. 그러니까 시는 목소리도 아니고 언어도 아니며 침묵도 아닌, 갑자기 다른 것들로부터 맹렬한 불길 속에서 얼굴도 없는 나를 건드리는 것은 아닐까.
늘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삶이 계속되고 있다. 어떤 메시지를. 어떤 교시를 가지고 오는 천사를. 미셸 세르는 이 세계가 온통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들로 가득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오늘도 '결정적 한 소식'을 기다린다.
아침이면 꽂혀있는 책들을 살펴보면서 인연이 닿을 책을 찾는다. 매일 새로운 책들을 검색하면서 내용을 살핀다. 만약 나에게 한 문장이 마치 시(詩)처럼 찾아온다면, 나는 벌써 가슴이 두근거리고 호흡을 멈추면서 경건한 자세로 책을 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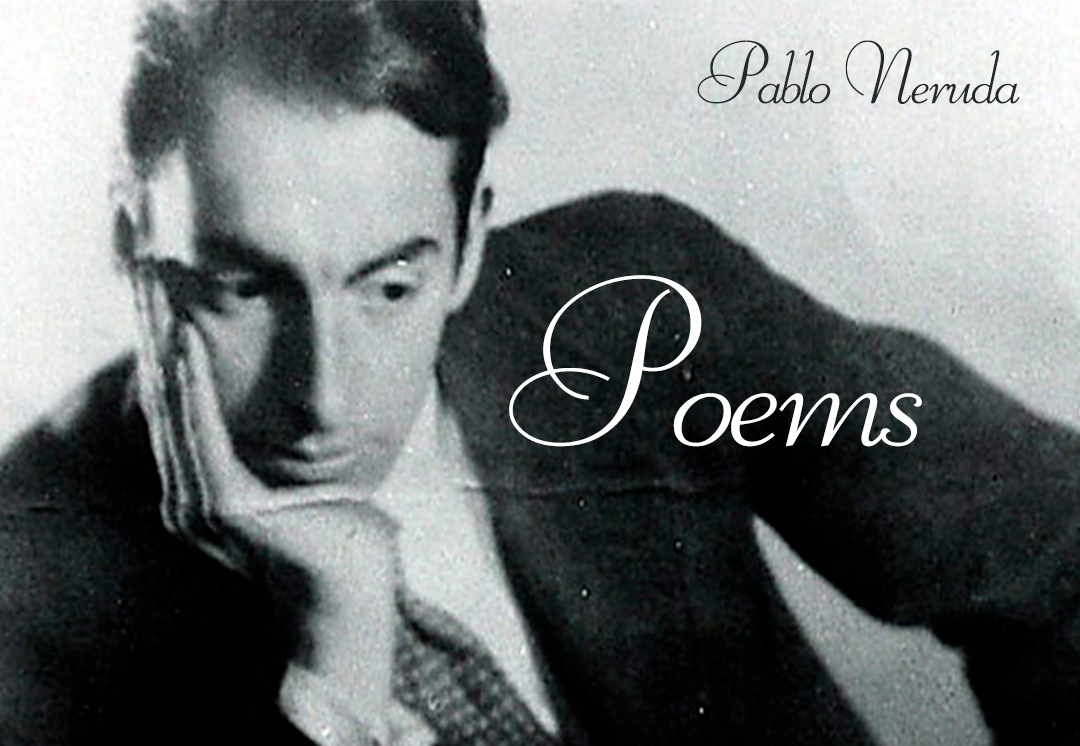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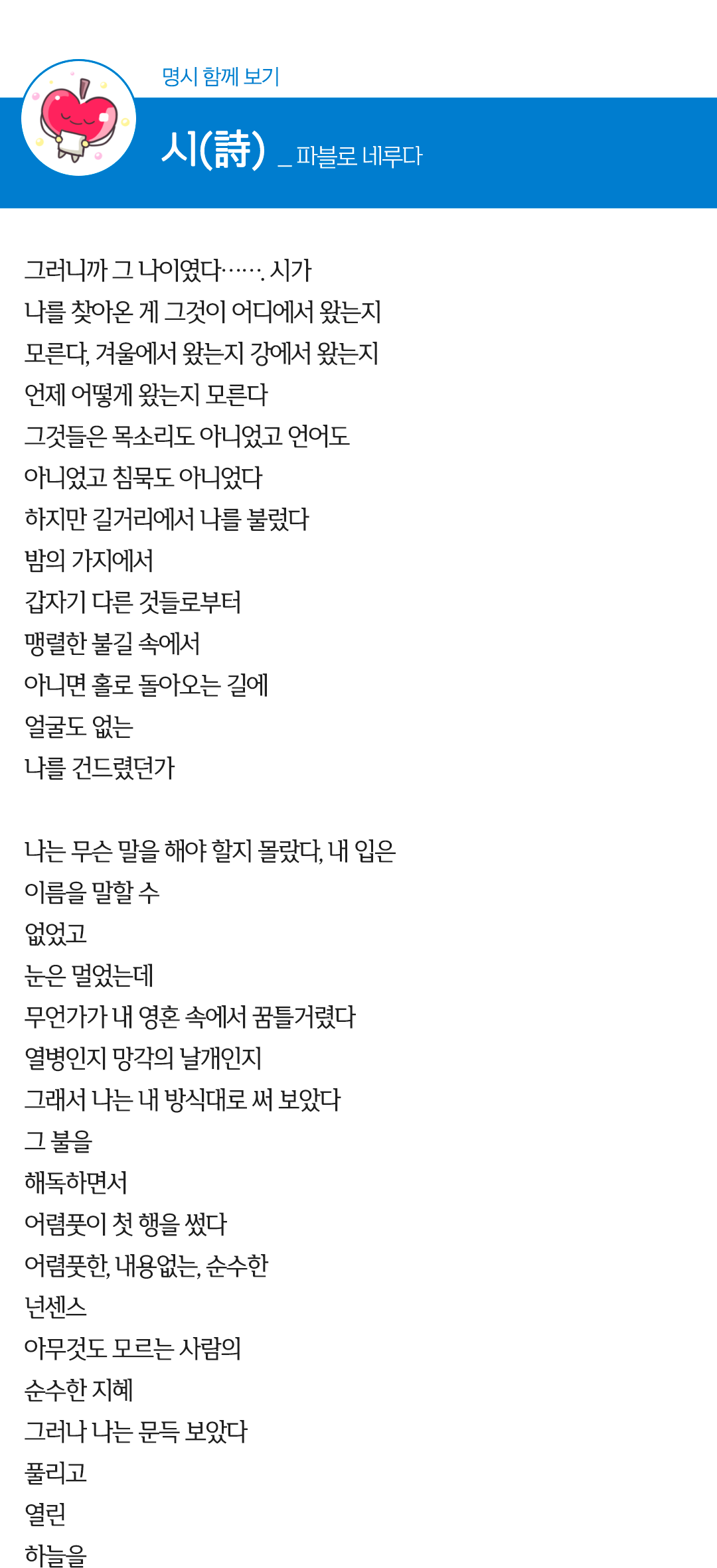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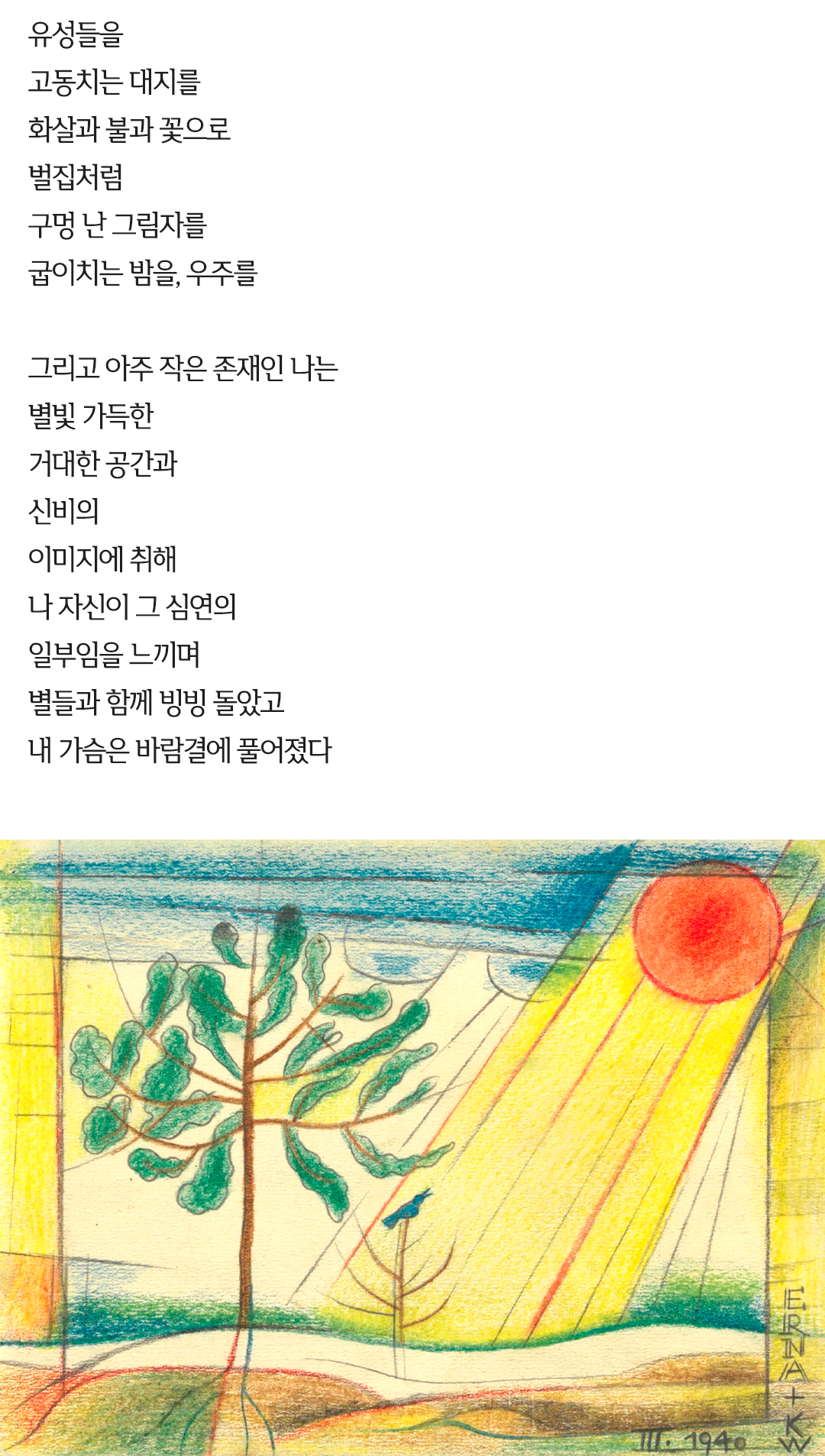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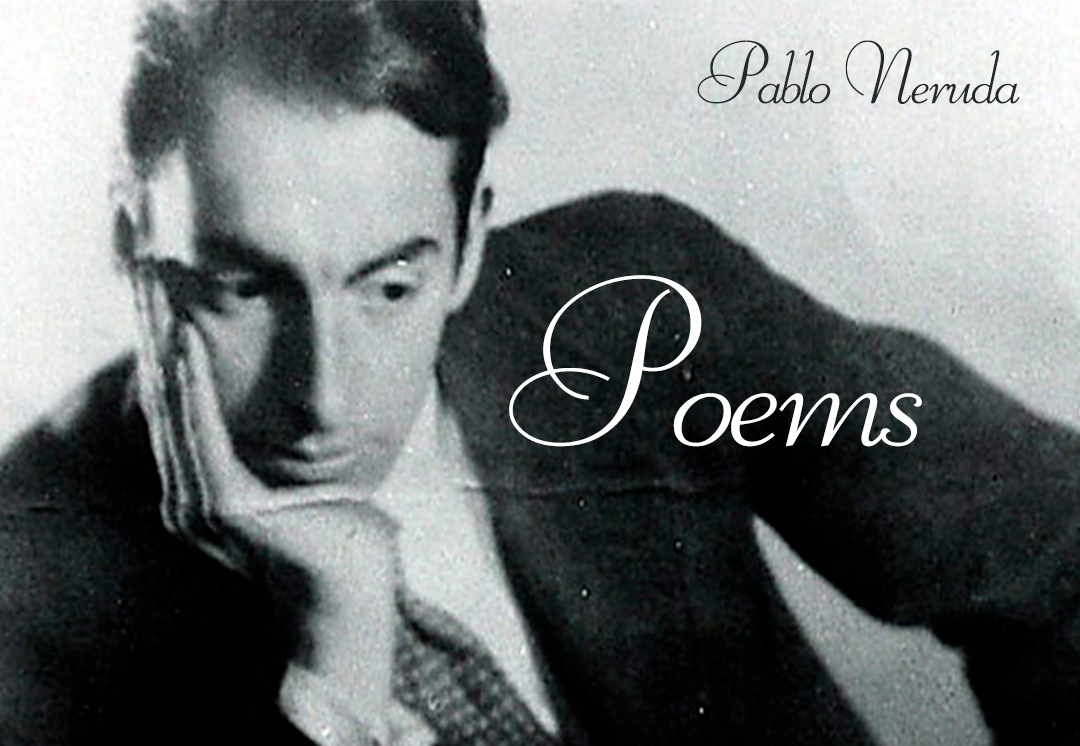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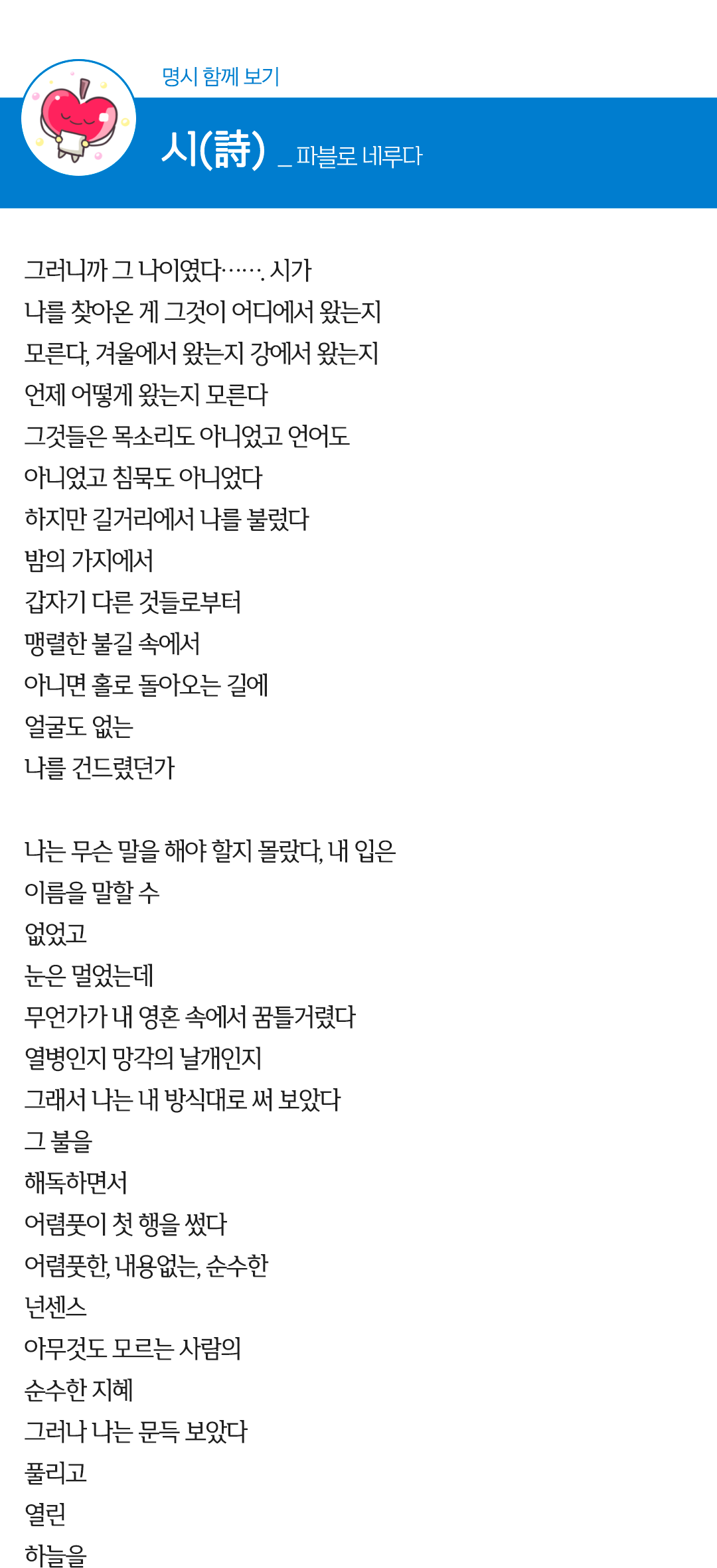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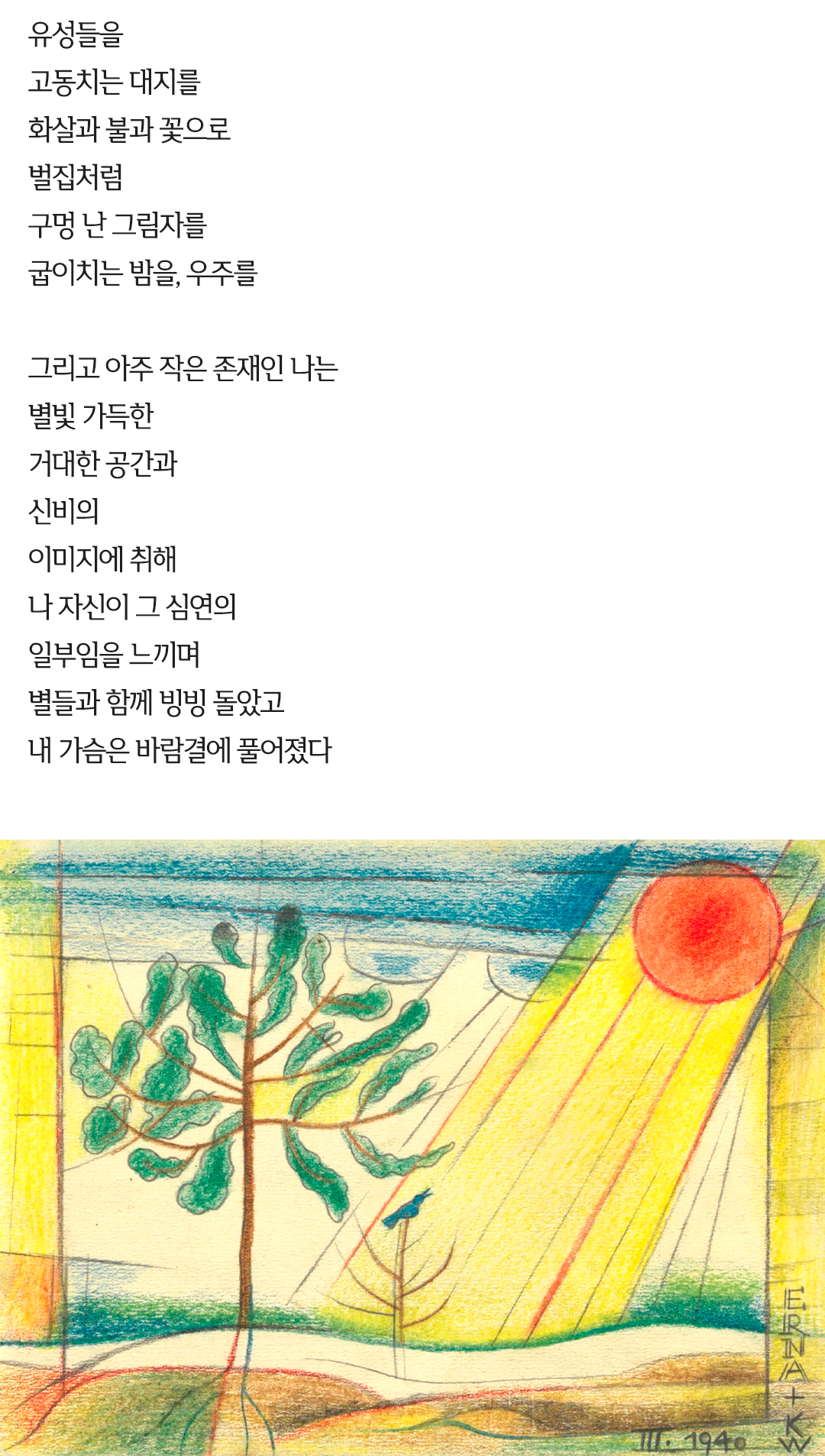

- 이전글[고전 1300] 모던타임즈 Essay 22.10.08
- 다음글[렛잇비 베이직] 지킬박사와 하이드 Essay 22.09.24
댓글 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