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숲 스토리 시즌1 Vol.11 지숲에는 모나드방, 피카소의 방, 아인슈타인의 방이 있다
 목록으로
목록으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지혜의숲
- 작성일
- 22-12-03 12:28
본문
지숲에는 모나드방, 피카소의 방, 아인슈타인의 방이 있다. 2003년, 지숲센터 교사진 일부가 분가해 새로 둥지를 튼 신규센터에서 공부가 한창이다. 이름만 들어도 머리에서 쥐와 김이 나는 ‘자연 예술 과학의 수학적 원형’ 세미나 시간. 박쌤 : 이 책은 그 말이 이 말 같고 이 말이 그 말 같아. 송쌤 : 내 말이! 그건 그렇고 교실 이름을 오늘까지 정해서 맡겨야 하는데…. 재쌤 : 나는 빼줘. 오늘 식사 당번이야. 혜쌤 : 수학적 원형들로 이름을 정하면 어떨까? 이구동성 : 그럼 니가 해. 지혜의숲에서 동료에게 듣는 가장 무서운 말이자 가장 듣고 싶기도 한 말. ‘니가 해.’ 아이디어를 내는 자가 기획하고 실행한다. 과정 중 필요한 도움은 우연히 그 옆에 있었거나 얼쩡거리다 걸린 자가 봉공한다. 그러니 결국 “니가 해.”는 자기 책임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동료를 합법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권한의 위임이었다. 한 머리보다 두 머리가 낫다. 두 머리보다 세 머리가 낫다. 결국 ‘수학적 원형’을 쥐나게 공부한 결과 우리의 머리들은 번듯한 교실 이름을 탄생시켰다. 모나드, 원은 세상의 통일성을 드러낸다. 디아드, 선은 만남을 꿈꾼다. 트리아드, 삼각은 조화를 낳는다. 엔네아드, 유한과 무한 사이의 지평선 … 예기치 않은 결과들은 이렇듯 부딪힘과 우발성 속에서 탄생했다. 어디 교실 이름 만이랴. 이제는 인구에 널리 회자되는(?) ‘지혜의숲’ 명은 또 어떤가. “선생님, 지혜의숲이란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응 그건 말이지.” “왜 지혜의숲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30년쯤 전에” “근데 날아가는 새는 왜 있어요?” 아이들은 대답을 듣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은 대답을 듣기 위해 세상에 오지 않았다. 그네들이 여기 있는 건 스스로 답을 찾고 자기만의 답을 구하기 위해서이지 이미 있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랬다면 세상은 풀 뜯고 열매 줍던 일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 같았을 것이다. “우리가 날아가는 새고 선생님이 우리를 감시하는 거야. 허수아비처럼.” 여덟 살은 말한다. 이해할 수 있다. “자유롭게 살라는 의미 아닐까?” 만 열 살이 넘었으니 “십대”라고 주장하는 열한 살이 말한다. 이해할 수 있다. 그래도 지면을 빌려 우리 이름의 역사를 기록해두고 싶다. 지혜의숲이라는 센터명은 1993년에 시작한 지숲네트피아(intelligence-network-utopia) 첫 센터의 교사 공간-교무실 이름이었다. 시작하려는 일이, 새로움을 도발하는 업임을 알고 가슴 설렐 때 우리는 모두 젊다. 정신의 젊음으로 방자한 혈기들은 고민했다. 사고력 교육을 하는 공간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시인 윤동주가 패, 옥, 희, 노루, 토끼,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북간도를 그리워했듯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로 교실 이름을 채웠다. 그들은 우리의 지향이자 또 다른 사유와 감성의 촉매제가 될 터였다. ‘피카소의 방’에는 ‘꿈’과 ‘우는 여인’이 걸렸다. 아이들은 물었다. ‘이 여자는 왜 손가락이 여섯 개예요?’ ‘그런데 나도 이렇게 슬플 때가 있어요.’ 그 시절 아이들과 주고받았던 질문과 생각들이 씨앗으로 모였다가 예술사고력 교재로 거듭 태어났다. 피카소의 방에서는 2차원 평면에 3차원 입체를 담았던 당돌한 피카소처럼, 고흐의 방에서는 겸허하며 엄숙했던 인상파 고흐처럼, 아인슈타인 방에서는 권위 앞에서 혀를 내밀고 샐쭉 웃는 아인슈타인처럼! 지혜의숲에는 원탁의 기사들이 까불까불 2020년을 강타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자 몇몇 교실은 원탁을 치우고 일렬로 일인용 책상을 배치했다. 3개월, 6개월, 9개월… 볼멘 아이들이 묻는다. 언제까지 영웅이 등만 보고 수업해야 해요? 언제까지 선생님은 앞에 있고 우리는 뒤에 있어야 해요? 학원 같잖아욧! 흘겨보는 눈들이 필통에서 곧 검이라도 뽑을 기세다. 그렇구나. 아이들에게 지숲은 학원이기 이전에 친구를 만나 소통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꺼내놓는 그러다 묘하게 똑똑해지기도 하는 이상한 공간이었구나. 일인용 책걸상을 두고 앉기 전까지는 원탁을 아이들이 그토록 사랑하는지 알지 못했다. 당연하게 지켜왔던 지숲 공간문화의 일부였기에 원탁을 들여놓았던 교사들도 그 의미를 잊고 있었다. 교사의 설명과 이해가 중심이 되는 강의식 수업이라면 일렬배치가 효율적이다. 하지만 그것은 쌍방향 소통과 연쇄적 상호교류를 막는다. 교사는 질문하고 아이는 답한다. 친구의 의견에 살을 붙여 또 다른 의문과 생각으로 나아가지 못한 답들은 툭, 툭 파편적으로 흩어진다. 등에 눈이 달리지 않았으니 앞에 앉은 아이나 뒤에 앉은 아이나 발표하는 친구의 표정과 몸짓 등 다채롭고 미묘한 비언어적 표현을 체감하기 어렵다. 귀와 눈이 동시 협응하지 못하니 말하기는 딱딱해지고 듣는 귀는 접힌다. 공감하며 듣기와 말하듯 자연스러운 발표하기란 고급한 언어문화의 징표 아니던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공감하는가. 상상도 일단 인간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한 후에야 가능해진다. 레비나스는 ‘타자의 윤리학’에서 얼굴을 마주하는 일의 숭고함을 말한다. 드라마에서 헤어지려는 연인에게, 더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 사람에게 “내 얼굴 보고 말해. 내 눈 똑바로 보고 말해!”라고 외치는 장면들을 보라. 엄청난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믿지 않는 이상 얼굴을 가까이 마주하고 무시무시한 욕설을 퍼 붙거나 눈을 바라보면서 거짓을 말하기란 어렵다. 나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얼굴은 아이러니하게도 등과 함께 타자의 시선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몸의 일부다. 나는 타자의 시선에 비친 나의 얼굴을 본다. 그의 눈에 비친 나의 얼굴을 본다. 그의 맑은 눈빛과 위로 올라간 입꼬리가 나의 존재를 조금 더 사랑하게 한다. 그 모습을 나도 닮아간다. 지혜의숲의 원탁은 ‘너 아닌 존재를 긍정하라’는 타자의 윤리학을 반영하고 있다. 존중하시오 그리하여 존중받으시오 라는 똘레랑스를 반영하고 있다. 일자와 함께하는 다자성! 때로 소수가 제 목소리를 내는 대신 다수 혹은 일반이 갖는 이데올로기를 답습하는 건 타자의 눈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진리이자 진실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의 시선에 드러난 혐오와 경멸, 비난과 경외, 찬탄이 내 얼굴의 현재성을 말해준다. 이렇듯 타인의 시선에 나를 맡길 수밖에 없기에 얼굴은 몸에서 가장 취약한 장소다.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은 대상에게 나를 내어줌이며 무저항의 열림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다. 지숲의 아이들은 눈을 보며 대화한다. 원탁에 둘러앉아 존엄과 평등의 애티튜드를 익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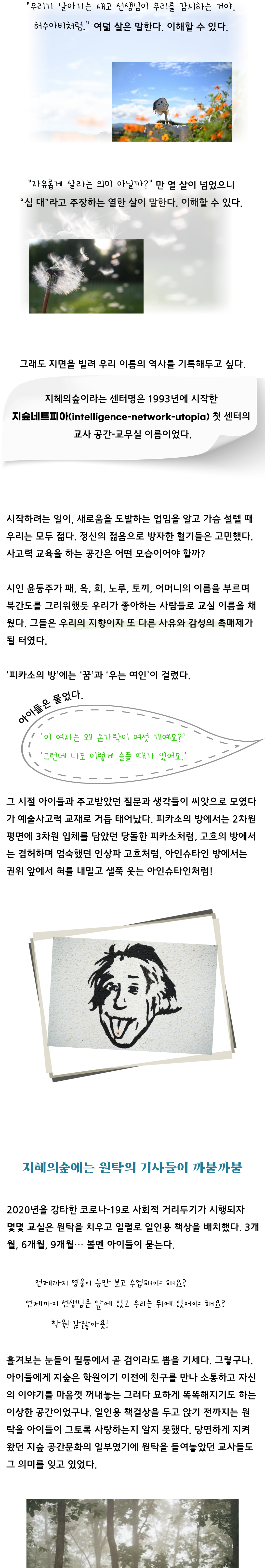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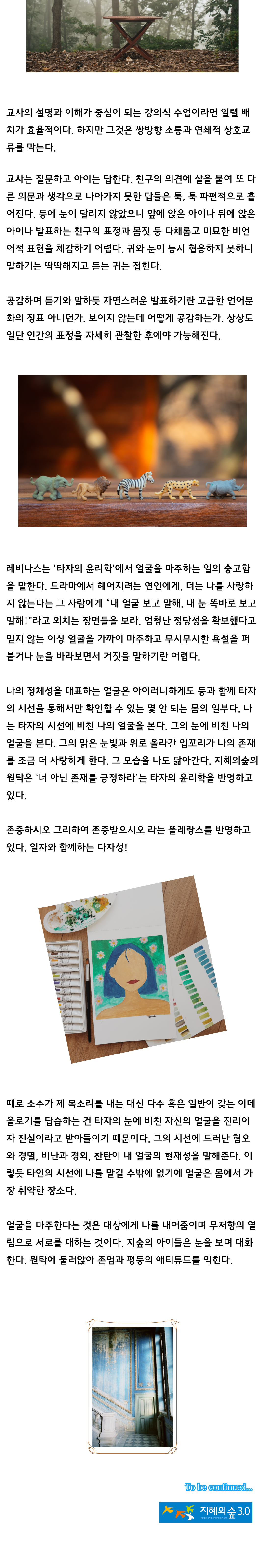
- 이전글지숲스토리 시즌1 Vol.12 몬드리안 속에서 살다 22.12.13
- 다음글지숲스토리 시즌1 Vol.10 마그리트와 연못을 사랑하는 아이들 22.11.25
댓글 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